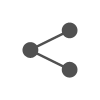카메라 무게
자동차 무게
카메라를 오랜만에 들었다. 그간 거의 모든 촬영을 박준영 기자가 담당했기 때문에 카메라 들 일이 없었다. 내가 카메라를 들지 않은 사이, 오토포스트가 성장하면서 카메라 장비도 업그레이드되었다. 장비가 많아진 탓에 무게도 꽤 무거워졌다. 대용량 배터리팩, 조명 등이 추가로 장착되면서 오래 들면 손목이 아프다.
무거워서 좋은 점은 딱 하나다. 카메라가 가벼울 때보다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랄까. 초점을 잡을 때 무거운 무게 탓에 잘 흔들리지 않는다. 좋은 점은 여기까지, 무거워서 좋을 건 없다. 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모터쇼 현장과 시승차 촬영 현장을 뛰어다닌 박 기자에게 다시 한 번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다.

촬영 내내, 그리고 시승 내내 ‘무게’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날씨도 유독 더웠기 때문에 무거운 카메라가 야속하기만 했다. 그리고 ‘G90’을 조금 몰아붙이기만 하면 느껴지는 무거운 차체도 야속했다. 조금만 가벼웠더라면 어땠을까.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스치던 시승이었고, 현대차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오늘 오토포스트 시선집중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차, ‘제네시스 G90’ 이야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사진 김승현 기자



3.8리터 V6 프레스티지
HTRAC 사륜구동
시승차는 오토포스트 법인 차로 이용하고 있는 제네시스 스펙트럼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받았다. 제네시스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한 달에 한 번씩 G90을 48시간, 2박 3일 정도 무료로 시승할 수 있다. 제공받은 자동차는 3.8리터 V6 프레스티지 모델이다. ‘프레스티지’는 3.8 모델 최상위 트림이다.
G90 3.8 모델은 315마력, 40.5kg.m 토크를 내는 3,778cc V6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과 자동 8단 변속기를 장착한다. 제공받은 자동차는 HTRAC 4륜 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모델이다. 공인 복합연비는 8.2km/L, 공차중량은 2,090kg이다.

Q. 편안한가?
A. 이제 노면 감지 서스펜션을
넣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
워낙 편안하고 푹신한 자동차를 좋아하는 편이라 G90이 마냥 잘 맞을 줄 알았다. 그런데 기대했던 편안함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다. 어딘가 부족해서 생각해보니 G90에겐 요즘 나오는 다른 플래그십 세단에 많이 들어가는 노면 감지 서스펜션이 없었다.
최근 부분변경된 ‘캐딜락 CT6’를 타면서 노면 감지 서스펜션을 몹시 인상 깊게 느꼈다. “1,000분의 1초마다 노면을 감지합니다”라고 거창하게 이야기해서 오히려 기대가 없었고, 사실 몇 분의 몇 초씩 노면을 감지하는지도 큰 관심 없었다. 내가 집중한 건 플래그십 세단으로 얼마나 편안하고, 푹신하고, 정숙한가였다.

CT6는 ‘S클래스’처럼 구름 위를 떠다니는듯한 승차감은 아니었다. 그런데 아주 똑똑하다는 느낌은 받을 수 있었다. 노면을 감지하는 서스펜션은 노면 기복과 요철을 기분 좋게 잘 넘고, 타이어는 소음을 잘 흡수한다. 모든 장비들이 각자의 역할을 매우 충실하게 수행한다.
G90에는 노면 감지 서스펜션이 없다. 좋지 못한 노면을 지날 때마다 “이제는 노면 감지 시스템과 연동되는 서스펜션을 넣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VIP를 위한 플래그십 세단이라면 편안함을 넘어 안락함, 거실 소파처럼 푹신함까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전자 장비도 중요하지만 승차감 개선을 위한 장비들이 많이 도입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다음 세대에선 부디 이것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

승차감이 아쉽다는 것 말고 편안한 주행에 있어 아쉬운 것은 없었다. 3.8리터 V6 자연흡기 엔진은 편안한 범위 내에서 차를 다루면 여유로운 가속을 보여주고, 엔진 소음 유입도 적다. 변속기도 편안한 주행에서만큼은 굼뜨거나 멍 때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운전석 시트는 푹신하고 편안하다. 콘티넨탈 타이어는 노면 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한다. 센터 터널이 국산차치고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라 아늑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알맞다. 고속도로에서 크루징 하기 좋다.



Q. 충분히 럭셔리한가?
A. 눈으로만 본다면
뒷자리에만 앉는다면 그렇다
뒷자리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조수석 시트가 완전히 접힌다. 고급스러운 아날로그시계가 센터패시아 중앙에 위치하고, 뒷자리 암 레스트에는 미디어 장치, 공조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이 화려하게 자리한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옆 창문과 뒷유리 커튼이 전동으로 스르륵 올라온다. 눈으로만 본다면, 그리고 뒷자리에만 앉는다면 충분히 “우와”할 수 있는 장비들이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으면 현대기아차의 고질적 문제를 실감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손에 닿는 소재 마감이 항상 아쉽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G90도 마찬가지였다. 운전자 손이 가장 자주 닿는 스티어링 휠이나 변속 레버를 감싸는 가죽은 조금 더 좋은 것을 써줬으면 좋겠다. 1억 원이 넘는 플래그십 세단인데 스티어링 휠에 땀이 차고 끈적끈적 거리는 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몇 없을 것이다.

Q. 운전하기 좋은가?
A. 하체는 탄탄하고 좋다
체중 감량이나 똑똑한 설계
둘 중 하나라도 갖출 필요
요즘은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편안함만 강조하지 않는다. ‘S클래스’에겐 ‘AMG’가 있고, ‘CT6’ 에겐 ‘스포츠’ 모델이 있듯 유명 자동차 제조사들은 하나같이 “우리 플래그십 세단은 스포티한 주행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대형 플래그십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친듯한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자동차도, 스포츠카 다운 움직을 보여주는 자동차도 있다.

G90의 탄탄한 하체는 칭찬할만한 것 중 하나다. 직선으로 쭉 뻗은 도로를 고속으로 주행해도 하체 떨림이 적어 안정적이다.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잘 제어한다. 과거 현대기아차는 하체가 불안정하다고 비판받아왔었는데, G90에서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자연흡기 엔진도 여유롭다. 차체가 무거워 부족함이 느껴지진 않을까 걱정했으나 고속에서도 여유롭다. 8단 변속기도 플래그십 세단 치고 반응이 괜찮았다. 자연흡기 엔진이라 높은 엔진 회전수를 요구하는데, 편안한 주행에서 조용하던 엔진음이 고회전 영역에선 카랑카랑하다.


그런데 코너를 만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코너에서 마음 놓고 속도를 올릴 수 없다. 제네시스를 비롯한 현대자동차는 경량화에 대해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거운 무게가 발목을 꽤 많이 잡고 있다. 연비는 물론이고 안정적인 움직임도 무게 때문에 피해를 본다.
무게를 줄여 코너에서 빛을 발휘하던지, 아니면 무거운 무게를 버틸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설계를 하던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적어도 북미 시장을 겨냥한다 했으니 경쟁자들보다 나은 면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차체가 커서 후륜구동이지만 언더스티어 성향이 나타난다. 이는 거의 모든 플래그십 모델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으나, 기술의 차이는 안정적이냐, 불안정하느냐에서 나온다. 고속 코너에서 작은 요철을 지나면 차체가 뒤뚱거린다. 마치 후륜 타이어가 그립을 잃듯 뒤뚱거려 자칫 잘못 제어하면 피시 테일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묵직하게 도로 위를 활보하는 느낌이 없어 아쉬웠다. 운전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무게 감량으로 차체가 받는 부담을 줄이고,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스펜션을 비롯한 차체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사람도 몸이 무거우면 체력 소모가 많고 움직이기가 힘들 듯 자동차도 몸이 무거우면 연료를 많이 먹고 움직임이 버겁다.

Q. G90 자동차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잘 찾아보기 힘들다
A.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G90이 되었으면 좋겠다
현대기아차를 이야기하면 대부분 전자 장비에 대한 말이 많다. 나는 최대한 자동차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오늘 시승기도 전반적으로 전자 장비 이야기는 제외하고 차체 움직임을 위한 장비들, 자동차 자체를 말하는 것들을 위주로 다루려 노력했다.
G90은 이번뿐 아니라 처음 EQ900 나왔을 때, G90으로 부분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이번 제네시스 스펙트럼 프로그램을 통해 세 번째 타본다. 그간 G90을 타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족함은 일종의 ‘장인 정신’이다.


지금 당장 둘 다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면 하나라도 제대로 충족해줄 때가 된 것 같다. 실내 인테리어, 내장재 하나하나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던가, 아니면 엔진을 비롯한 자동차 자체 만듦새에 있어 장인 정신이 느껴질 때가 되었다. 현대차가 내세우는 가장 비싼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플래그십 세단이라면 실내 공간에서 예술적인 감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나오는 내로라하는 대형 플래그십 세단들이 모두 그렇다. G90 에겐 아직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면 주행 질감이라도 현대자동차와 조금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다. 과속방지턱을 똑같이 지나가고, 코너에선 똑같이 무겁다.

Q. 가격은 어떤가?
A. 1억 1,000만 원 정도다
깊은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제공받은 자동차는 3.8리터 V6 프레스티지 모델이다. 추가 옵션 없이 가격은 1억 1,000만 원 정도다. 정확히 말하면 1억 995만 원이다. 철저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았다. 운전을 주로 하는 고객이라면 9,768만 원짜리 ‘캐딜락 CT6 플래티넘’과 고민될 것 같다. 편안한 주행 질감은 CT6가 더 낫다.
뒷자리를 주로 앉는 고객이라면 1억 3,320만 원짜리 ‘렉서스 LS V6 럭셔리’ 모델과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다. ‘럭셔리’는 LS의 세 가지 트림 중 두 번째 트림이다. ‘G90 프레스티지’ 트림과 옵션 구성이 비슷하다. 렉서스가 지금 공식 할인 500만 원을 제공하고 있어 가격도 1억 2,820만 원까지 떨어진다. G90과 LS를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있는 고객이라면 둘을 두고 깊이 고민할 것 같다.

Q. 누구를 위한 차인가?
A. 운전석보단 뒷자리다
한국에서 제일 비싼 국산차다. 그들에게 시승기가 얼마나 의미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G90은 운전석보단 뒷자리 승객을 위한 자동차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한 소리 맞다. 애초에 뒷자리에 타는 승객을 겨냥하고 나온 차다.
오늘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약간 다르다. 애초에 차가 그렇게 나와서가 아니라, 운전석에서의 부족함 때문이다. 뒷자리에 타면 한없이 호화롭다. 뒷자리에 타면 승차감도 그리 나쁘다는 것을 못 느끼고, 시트는 푹신하고, 버튼만 누르면 거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만큼은 ‘제네시스’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뒷자리 승객에겐 충분히 좋다.


그런데 단순히 뒷자리만 타고 내리는 고객이 아니라 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끔 운전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아쉬움을 감출 수 없을 것 같다. 경쟁 모델로 꼽히는 자동차들보다 장인 정신이 뛰어난 것도, 똑똑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플래그십 세단이라면 브랜드 가치와 기술을 과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G90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생각해보면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제네시스를 비롯한 현대기아차를 두고 “옵션만큼은 현대기아차 따라올 차가 없다”라고 말한다. 이제는 “주행 성능만큼은 현대기아차 따라올 차가 없다”, “코너링 하나는 현대기아차가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전자 장비가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좋다는 말이 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 이미 현대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미 시장에서 잘 팔리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듣고 있는 말이다. 오토포스트 시선집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