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자동차 일화
와전된 이야기도 있어
올바른 내용 살펴보니

기아 스포티지 1세대 / 사진 출처 = “Wikipedia”
자동차 산업의 역사가 한 세기를 훌쩍 넘는 만큼 흥미로운 일화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우연한 발견이 두고두고 쓰이는 발명품이 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말한 마디가 역사를 좌우한 사례도 존재한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마니아들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는 건 꽤 재밌는 일이 될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사실로 통용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까지 정설로 통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잘못된 내용인 것으로 밝혀진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았다.
글 이정현 기자

1966년형 젠슨 FF / 사진 출처 = “Silodrome”

스바루 레오네 1세대 왜건 / 사진 출처 = “Panay News”
사륜구동 원조는 콰트로?
앞서 만든 회사 2곳 존재
사륜구동 시스템 ‘콰트로’는 ‘아우디’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다. 흔히 아우디 콰트로가 최초의 스포츠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조는 따로 있다. 한때 영국에 존재했던 자동차 제조사 ‘젠슨(Jenson Motors)’은 1966년 2도어 GT ‘인터셉터(Intercepter)’의 차체에 크라이슬러 V8 헤미 엔진과 퍼거슨의 사륜구동 변속기를 얹은 모델 ‘FF’를 선보였다. 하지만 당시 사륜구동 스포츠카는 딱히 관심받지 못했고 젠슨 FF의 5년간 누적 판매량은 고작 320대에 그쳤다.
이후 시간이 흘러 1972년, 일본 자동차 제조사 스바루는 임프레자의 전신 ‘레오네’에 사륜구동 옵션을 제공했는데 이는 아우디 콰트로보다 먼저 대량 생산된 사륜구동 승용차로 기록됐다. 레오네에 탑재된 사륜구동 옵션은 훗날 스바루 고유 사륜구동 시스템 ‘시메트리컬(Symmetrical)‘의 기반이 되었다. 시메트리컬을 얹은 임프레자 랠리카는 WRC(월드 랠리 챔피언십) 무대에서 우승 트로피를 싹쓸이하며 스바루 최고 전성기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등극했다.

1934년 에펠레닌 경기 당시 메르세데스-벤츠 W25 실버 에로우 / 사진 출처 = “Autoblog”

메르세데스-벤츠 W25 실버 에로우 / 사진 출처 = “Wikipedia”
실버 에로우 비하인드 스토리
벤츠 본사도 잘못 알고 있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전설적인 레이싱카 ‘실버 에로우’는 페인트를 벗겨낸 모습이 마치 은빗 화살 같다는 표현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 실버 에로우의 차체에 그 어느 도장도 없는 이유는 벤츠 본사마저도 마케팅 수단으로 쓸 정도로 유명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흔히 알려진 내용은 이렇다. 1934년 ‘에펠레닌’ 경기에 출전할 벤츠 W25 레이싱카의 중량이 규정치인 750kg을 넘어서자 엔지니어들이 밤새 페인트를 벗겨내 무게를 줄였고 겨우 750kg에 맞춰 출전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메르세데스-벤츠 그랑프리 팀의 매니저 ‘알프레드 뉴바우어’의 회고록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없었다. 그의 회고록에 따르면 실버 애로우가 은색인 이유는 맑은 오후에 햇빛 반사로 레이싱카를 가장 눈에 띌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무게 규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에펠레닌 경기의 상세 규정은 현재도 명확한 문헌으로 남아있다.

페루치오 람보르기니 / 사진 출처 = “Wikipedia”

1963년형 페라리 250 GT 루쏘 / 사진 출처 = “Ferraris Online”
람보르기니 설립 비화
근원조차 알 수 없다
페라리와 함께 슈퍼카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람보르기니’의 설립 비화는 자동차에 크게 관심 없는 이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하다. 당시 트랙터 제조사를 운영하던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페라리의 단골이었으며 자신의 페라리 차량에 지속적인 클러치 결함이 발생하자 엔초 페라리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조언을 들은 엔초 페라리는 “평생 트랙터나 타라“는 식으로 문전 박대했고 이에 분노한 페루치오 람보르기니가 슈퍼카까지 만들기 시작했다는 게 흔히 알려진 이야기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다르다. 40년 넘게 람보르기니에서 근무한 엔지니어 ‘발렌티노 발보니’의 회고록에 따르면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운전 미숙으로 자신의 페라리 250 GT를 몰며 클러치를 자주 태워 먹었다. 이에 페라리 공장을 자주 들렀다는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엔초 페라리와 언쟁이 오갔다는 기록은 없다. 무엇보다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는 당시 트랙터 사업의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971년형 아우토비앙키 A112 아바쓰 / 사진 출처 = “Flickr”

1974년형 생카 1100Ti / 사진 출처 = “Pinterest”
핫해치 원조는 골프 GTI?
10년 전부터 존재한 용어
폭스바겐 골프 GTI는 작지만 화끈한 성능을 뽐내는 해치백 ‘핫해치’의 원조를 논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모델이다. 정말 골프 GTI가 원조 핫해치로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최초는 따로 있다. 폭스바겐 골프가 등장하기 한참 전인 1960년대부터 미니 쿠퍼 S를 통해 핫해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으며 업계는 최초의 핫해치로 1971년 출시된 독일 ‘아우토비앙키’의 A112 아바쓰를 꼽는다.
이후 1974년에는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 ‘생카(Simca)’가 해치백 1100의 고성능 모델 Ti를 선보였으며 르노 5 알핀은 골프 GTI보다 2개월 일찍 출시되었다. 무엇보다 핫해치는 전륜구동 고성능 해치백을 뜻하는 단어로, 세그먼트 분류가 아닌 만큼 확실한 정의가 없다. ‘슈퍼카’ 혹은 ‘하이퍼카’ 역시 마찬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초창기 핫해치의 개념에 가까운 모델은 현재의 골프 GTI보다는 푸조 208 GTI, 포드 피에스타 RS, 현대 i20 N과 같은 소형 해치백을 꼽을 수 있다.

기아 스포티지 1세대 / 사진 출처 = “Wikipedia”
일본이 우기는 최초 타이틀
사실은 한국이 주인공이다
토요타는 자사의 준중형 SUV ‘RAV4’를 최초의 도심형 SUV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국산차가 먼저였다. 1991년 기아자동차는 도쿄 국제 모터쇼에 개발 중이던 스포티지 콘셉트 모델을 전시했는데 당시 스포티지가 자동차 업계에 미친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오프로드 주행을 지향하는 우락부락한 SUV가 일반적이었던 당시에 도심형 SUV는 틀을 제대로 깨버린 장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스포티지는 토요타 RAV4보다 1년 앞선 1993년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으나 스포티지보다 먼저 비슷한 콘셉트를 지향한 차도 존재한다. 바로 스즈키 에스쿠도다. 다만 에스쿠도는 스포티지나 RAV4와 달리 차체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소형 오프로더에 더 가까운 모델인 만큼 진정한 도심형 SUV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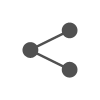

댓글1
Jen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