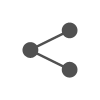오토포스트 소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5년 동안 지켜 왔던 삶의 터전을 화마가 순식간에 휩쓸어가 버려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된 임시 장소… 골목 식당을 살리기 위해 설루션을 제시해주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원주 시장 한편에 있는 칼국숫집의 사연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칼국숫집에서 운영하고 있던 메뉴는 아홉 가지. 음식만큼은 까다롭고도 냉정하게 평가하기로 소문난 백종원 씨도 극찬한 칼국숫집 사장님의 꾸미지 않은 손맛은 손님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순수한 사장님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음식만큼이나 정겹고 따듯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칼국숫집에서 운영하고 있던 메뉴는 아홉 가지. 음식만큼은 까다롭고도 냉정하게 평가하기로 소문난 백종원 씨도 극찬한 칼국숫집 사장님의 꾸미지 않은 손맛은 손님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순수한 사장님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음식만큼이나 정겹고 따듯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된 임시 장소, 리모델링 후 첫 장사를 앞두고 그가 칼국숫집 사장님에게 제시한 설루션은 메뉴를 줄이는 것. 조리시간과 동선을 단축할 수 있도록 화구와 냄비, 그리고 냉장고와 수도 시설이 늘어났음에도 그는 오히려 메뉴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된 임시 장소, 리모델링 후 첫 장사를 앞두고 그가 칼국숫집 사장님에게 제시한 설루션은 메뉴를 줄이는 것. 조리시간과 동선을 단축할 수 있도록 화구와 냄비, 그리고 냉장고와 수도 시설이 늘어났음에도 그는 오히려 메뉴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까지 고려하여 아홉 가지에서 줄어든 최종 메뉴는 세 가지. 인테리어를 비롯한 메뉴 리모델링까지 완료된 후 시작된 첫 장사. 새로 생긴 수도 시설로 동선이 짧아졌고, 냄비와 화구도 많아진 덕에 훨씬 수월하게 장사가 진행되는 듯했으나 순조로운 출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몰려드는 손님에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새로운 주방 구조, 파도처럼 밀려드는 주문에 바빠지는 마음, 익숙하던 자리에 없는 재료를 찾느라 빼앗기는 시간,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 실수로 이어졌고, 결국 주문을 취소하고 자리를 떠나는 손님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장사를 위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지만 사장님에게는 새로운 주방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몰려드는 손님에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새로운 주방 구조, 파도처럼 밀려드는 주문에 바빠지는 마음, 익숙하던 자리에 없는 재료를 찾느라 빼앗기는 시간,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 실수로 이어졌고, 결국 주문을 취소하고 자리를 떠나는 손님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장사를 위한 조건이 모두 갖춰졌지만 사장님에게는 새로운 주방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콩국수, 칼국수, 팥죽… 이거면 충분해요!” 아홉 가지 메뉴에서 무려 여섯 가지를 뺐던 그의 과감한 결정이 생각보다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 문득 떠오른 어느 기업. 비록 규모와 결은 하늘과 땅 차이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설루션만큼은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는 어느 기업이 자동차 관련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머릿속을 선명하게 스쳐갔습니다.
“콩국수, 칼국수, 팥죽… 이거면 충분해요!” 아홉 가지 메뉴에서 무려 여섯 가지를 뺐던 그의 과감한 결정이 생각보다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쯤 문득 떠오른 어느 기업. 비록 규모와 결은 하늘과 땅 차이일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설루션만큼은 비슷할 것이라 생각되는 어느 기업이 자동차 관련 글을 쓰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머릿속을 선명하게 스쳐갔습니다.

밀려드는 손님, 몰려드는 주문, 그러나 좀처럼 따라주지 않는 조리 속도와 시간이 낳은 결과는 손님들의 기다림. 새로운 주방에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다음날에도 계속될 복잡하고도 바쁜 하루가 이 기업에게도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쌓이고 쌓인 대기 물량 3만 5천 여대, 어떤 매체에서는 4만 대라고 보도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좀처럼 따라주지 않은 생산 능력으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고되어 있는 북미 시장 출시까지… 그들은 칼국숫집 사장님처럼 새로운 환경에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까.
밀려드는 주문에 쌓이고 쌓인 대기 물량 3만 5천 여대, 어떤 매체에서는 4만 대라고 보도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나 좀처럼 따라주지 않은 생산 능력으로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소비자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고되어 있는 북미 시장 출시까지… 그들은 칼국숫집 사장님처럼 새로운 환경에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까.
 4만 대 가까운 대기 물량에도 그들은 생산량 확대 반대를 고집했었습니다. 치열한 기싸움 뒤에 얻어낸 결론은 생산 물량을 40% 늘리는 것. 그러나 여전히 대기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4만 대 가까운 대기 물량에도 그들은 생산량 확대 반대를 고집했었습니다. 치열한 기싸움 뒤에 얻어낸 결론은 생산 물량을 40% 늘리는 것. 그러나 여전히 대기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들여오거나 생산 물량을 늘리려면 그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그들의 합의 없이 기업은 어떠한 대책도 추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의가 절실하고도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절실하고도 적극적인 합의는 지금껏 없었다고 보이는 최근의 근황들이 민낯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들여오거나 생산 물량을 늘리려면 그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그들의 합의 없이 기업은 어떠한 대책도 추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의가 절실하고도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절실하고도 적극적인 합의는 지금껏 없었다고 보이는 최근의 근황들이 민낯처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 100%”라는 말이 무색하게 1974년 이래 처음으로 적자, 영업 손실은 593억 원. 가동률은 100%에 달했지만 정작 공장 효율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생산을 늘릴수록 수익성이 나빠지는 악순환까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포화상태인 것인지, 포화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와는 정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해외 공장 상황. 미국 공장은 2011년 이래로 최저 가동률을 기록했고, 중국 공장은 가동률이 반 토막 나면서 구조조정까지 들어간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들의 생산력과 효율성이 한국 공장 근로자들보다 떨어져서 그랬던 것일까.
 “노조 동의를 얻어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현대차 단체 협약이 있다”, “해외에서 생산된 현대기아차가 한국에 들여오려면 노조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동의와 협의를 얻기 위해 손을 내밀었더니 돌아온 답변은 “근무 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거부감이 크다”, “잔업과 특근이 줄어 임금 줄까 우려하여 반대”
“노조 동의를 얻어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현대차 단체 협약이 있다”, “해외에서 생산된 현대기아차가 한국에 들여오려면 노조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동의와 협의를 얻기 위해 손을 내밀었더니 돌아온 답변은 “근무 강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현장에서 거부감이 크다”, “잔업과 특근이 줄어 임금 줄까 우려하여 반대”
 “이래서 메뉴를 줄이라고 했구나”…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고려했던 그의 결정은 실제 혼돈의 현장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비로소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던 결론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 때 한 마리 토끼를 포기하면 적어도 다른 한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있다는 옛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메뉴를 줄이라고 했구나”… 찾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고려했던 그의 결정은 실제 혼돈의 현장을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비로소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결정을 통해 얻을 수 있던 결론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 때 한 마리 토끼를 포기하면 적어도 다른 한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있다는 옛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공장과 관련된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모든 단체가 ‘합의’라는 단어와 거리가 먼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던 최근. 오래도록 특정 집단이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행위에 정당함이라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들의 부당함은 곧 피해로 이어지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공감해주기 힘든 지경에 이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메뉴를 줄일지 소비자를 줄일지 선택하세요”… 오늘의 소셜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