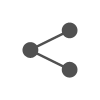뛰는놈 위에 나는놈 있다
티코와 함께 전설적인 국산 경차
마티즈 디아트


때는 1990년대 후반기, 밀레니엄을 앞두고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풍문이 떠돌던 그 시절의 대한민국은 보다 경제적이고 작은 차의 열풍이 불던 시기였다. 1995년에 시행된 경차 혜택을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대우 국민차의 티코의 열풍이 불었고, 여기서 가능성을 본 현대차는 1997년 아토스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후 1998년 3월 대우차는 이에 질세라 막강한 적수를 내놓게 되는데, 그 차는 바로 오늘날에 전설로 남은 ‘황마’의 시초 마티즈다. 출시 당시 귀여운 디자인으로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었으며, 특히나 무채색 계열이 전부였던 국내 자동차 시장에 금색 컬러를 내놓으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냈다. 따라서 대우차의 전대미문 효자상품이자 대우차의 살림꾼이었던 마티즈는 알고 보면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라인업이 존재했다. 그중 오늘 알아볼 마티즈는 ‘한정판 마티즈’ 디아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보자.
글 권영범 에디터



원래 마티즈를
위한 디자인이 아니었다
디자인의 모티브는 피아트 친퀘첸토 루치올라의 컨셉트카였다. 이 디자인은 사실 마티즈를 위한 컨셉트카가 아니었으며, 이름에서도 보이다시피 피아트 500의 후속 모델을 위한 제안형 컨셉트카였다.
1992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피아트에 의해, 피아트를 위한 디자인을 발표한 이탈디자인은 그들이 봐도 꽤나 괜찮은 디자인을 뽑아냈었다. 그만큼 자신 있었고 당연히 디자인에 관심을 보여 가져갈 줄 알았으나 놀랍게도 피아트 측에선 관심을 주지 않았다.

피아트를 시작으로 그 누구도 이 컨셉카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결국 모든 걸 포기한 이탈디자인의 루치올라는 그대로 사장될 뻔했으나, 선뜻 손을 내밀어 준 곳이 바로 대우자동차였다. 자동차를 개발할 때는 본래 디자인과 같이 설계를 진행하는 게 보편적인 방식이었으나, 대우차는 조금 달랐다.
개발 당시에는 이미 디자인이 확정되어 있었고, 그 디자인에 맞게끔 설계를 하는 ‘탑다운’방식의 개발이었다. 그러다 보니 개발진들의 고민이 무척이나 깊었으나 다행히도 루치올라의 디자인을 본 대우차는 ‘가능성’이란 카테고리를 발견했다. 이러한 히스토리 속에서 마티즈의 디자인이 완성된 것이다.


현대가 대우에게
디스 했던 내용
도토리들의 전성시대
이 둘이 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아토스는 직렬 4기통의 0.8L 입실론 엔진을 장착하였고, 마티즈는 3기통 F8CV 엔진을 장착했다. 그리고 이 팩트는 곧 현대차가 마티즈를 까내기리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러나 마티즈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경차 시장을 모조리 독차지하며 현대차의 아토스, 기아차의 비스토를 산산조각 부숴버렸고 결국 단종되게 만들어버린 쾌거를 가지고 있다.

경차 규정이 1,000cc로 바뀌지 전까지는 한동안 한국에서 생산하는 유일한 경승용차로써 그 자리를 톡톡히 해내었다.
그러나 이 마티즈도 승승장구해 나가는듯해 보였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마티즈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게 만드는 최대 실수가 존재했으니 그건 바로 CVT 미션의 출시였다.

간단히
설명하는
마티즈의 CVT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1999년에 최초로 출시된 마티즈 CVT는 한때 “경차에 알맞는 변속기”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빠른 응답성과 기존 3단 변속기 대비 우수한 동력성능을 자랑하여 마케팅에 지대한 공을 들였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이게 말도 안 될 정도로 하자 덩어리라 아직도 한국GM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 중인데, 이 CVT가 투스카니 GTS-ll에 들어가는 6단 수동변속기 일명 ‘아이치’미션이라 불리는 명기를 만든 회사 아이치기공에서 만든 경차용 CVT 변속기였다.

그러나 이 CVT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는데, 마티즈에 들어가는 경차용 CVT가 별도로 마티즈를 위해 만들어지거나 튜닝을 거쳐서 만들어진 변속기가 아닌, 일본 내수용 660cc 짜리 무단 변속기를 별다른 조율 없이 거의 원판 그대로 장착했단 점이다.
이 말인즉 800cc 대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마티즈의 강력한(??) 출력을 감당하기엔 변속기가 너무 버겁단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허용 토크가 현저히 낮은 변속기를 장착했던 것이었고, 그 결과 엔진에서 변속기로 들어가는 입력축과 결합된 풀리가 이탈되거나 입력축과 출력축을 이어주는 회전 동력 벨트가 끊어지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대재앙급 CVT는 2005년 마티즈 2가 단종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쓰였다.


최초의
한정 판매 경차 디아트
1998년 10월에는 수작업 바디 파츠와 가죽, 크롬 등으로 고급스럽게 한껏 꾸민 마티즈 디아트가 월 50대 한정으로 판매가 이뤄졌다.
깜찍하고 앙증맞은 디자인과 디아트만의 시그니처인 베이지와 그린 컬러의 조합은 단연 돋보였고, 전면 철제 범퍼가드는 디아트만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았다.

일종의 스페셜 에디션으로 만들어진 마티즈 디아트는 이 당시에 ‘패션카’라는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데는 충분했다. 다만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의 반응이 문제였을 뿐이었다.
당시 경차로서 사치품인 ABS, BBS st 알루미늄 휠, 중형 차에서나 볼법한 프로젝션 타입의 안개등, 하이그립을 표방하는 175 시리즈 광폭타이어, 90년대에 알아줬던 블랙톤 우드그레인, 듀얼 에어백, CD-체인저 등등 곳곳에 차별화를 둬 고급화를 꾀하였다.


당시 미디어도
경차답지 않은
고급스러움에 극찬하다
90년대 세기말 미디어에서도 마티즈 디아트의 평가는 꽤나 후했다. 이 당시 미디어의 평가에서도 “준중형급 이상의 고급 사양이 눈에 띄어”를 강조했으며, 마티즈의 고향 창원에서 20명의 정예요원 ‘특수작업팀’이 디아트를 수작업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200m를 12.9 초 만에 주파하는 고성능에 감탄하였고, 호쾌한 144km/h의 최고 속도는 마티즈가 내세우는 최고의 강점 중 하나였다. 당시에 795만 원이라는 가격이 결코 작은 금액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10월에는 150대의, 11월에는 100대가 계약되는 호재를 맞이하였다. 그만큼 디아트만의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이었으며, 당시의 평가는 “희소성 높은 예술품으로서 소장 가치가 있는 차량인 셈이다”라는 평이 나오기까지 했다.


마티즈 디아트,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돌아다니는 차량이 더러 보였으며 마티즈가 흔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톡톡 튀는 외모에 차를 좋아하는 이들은 언제나 한 번쯤 뒤돌아 보게 만들던 모습을 지녔다. 현재로서 마티즈 디아트의 공식적인 매매 시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셈이다.
지금은 마티즈란 존재를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만큼 세월이 흐른 탓도 존재하지만, 서서히 경차 시장이 축소되고 있으며 점차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경차에 대한 투자가 과거 대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자동차 업계도 신박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줄어듦에 가끔은 지루하지만, 이렇게라도 잠시나마 명작들 덕분에 시간여행하는 것도 썩 나쁘진 않은듯하다.
autopost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