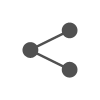사고 처리에 중요한 현장 촬영
하지만 2차사고 위험에 노출
최근 관련 사고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교통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것은 2차 사고 노출 위험에 있으며, 최근 관련 사례가 나와 전문가들이 주의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아래에서 살펴보자.
글 이진웅 에디터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지난 12일, 인천의 한 고가차도에서 차량 두대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비상등을 켠 뒤 피해 차량 운전자는 파손 부위를 촬영하다가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승합차에 치였다. 이후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 15일에는 장성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에서 SUV 차량이 앞서 달리던 14톤 화물차를 들이받아 옆으로 넘어진 상태였다. 이후 사고를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가 SUV 운전자를 구하고 있었는데, 2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SUV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와 이를 구하려던 다른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
2차 사고는 이미 사고가 발생했거나 고장으로 정지해 있는 차를 뒤따르던 다른 차가 추돌하는 사고다. 특히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2차 사고가 오히려 더 위험한데,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총 269건의 2차 사고 중 사망자가 무려 162명이 나왔다. 치사율이 무려 60.2%에 해당하는 수치다. 1차 사고의 치사율 8.6%와 비교하면 7배나 높다.
한국도로공사는 “1차 사고 후 운전자가 후속 조치를 위해 도로에 나왔다가 차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라며 치사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했으며, “사고 이후 현장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사고가 났다면
최소한의 안전 조치 후
대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옛날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과실을 따지기 위해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했지만 블랙박스가 대부분 보급된 현재는 블랙박스 영상 혹은 주변 CCTV 영상만으로 사고 정황이나 과실 비율을 모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최소한의 안전 조치 후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사고가 발생한 후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면 우선 도로 가장자리로 차를 옮긴 후 보험사나 경찰을 부르는 것이 좋다. 만약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비상등을 켠 후 트렁크를 열어 후방에 비상 상황임을 알린 후 현장에서 대피하는 것이 좋다. 비상등 점등과 트렁크를 여는 것만으로도 후방에 경고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이 실험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 그리고 경찰이나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연락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삼각대 설치하는 것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 사고처리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임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