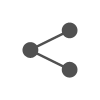현시대의 자동차들은 소위 말하는 감성이 사라진지 오래다. 도어 캐치를 당기는 순간부터 ‘찰칵’이 아닌, 묵직한 소리나 내고, 하나부터 열까지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자의 의도를 파악해 움직여주는 세상이다 보니 날것 그대로의 운전을 좋아하는 오너들에겐 그다지 반갑지 않은 현실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올드카들은 자동차 날 것 그대로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무엇인지, 자동차와 운전자가 물아일체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잘 알려주기 때문이다. 당장 흔하디흔한 아반떼 XD만 몰아봐도 바로 느껴질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자 제어장비를 다 꺼버리면 되는 일이긴 하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빵빵해지는 NVH 하며, 내가 차를 운전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땅 위를 떠다니는 건지 모르는 조금의 이질감과, 자꾸만 운전자를 이기려 드는 안전 보조 장치들은 “이건 차가 아니야!”를 되뇌며 다시금 옛 추억에 빠지곤 한다. “그땐 그랬지”, “그때 그 차 참 재밌었지” 하곤 말이다.
글 권영범 수습 에디터


혼다 레전드의 뱃지 엔지니어링
사실상 대우에서 수입해왔다 봐도 무방하다
대우자동차가 1994년 2월에 출시한 전륜구동의 대형 세단이다. 혼다와 공동 개발한 승용차라고 홍보하였으나, 실상 혼다 레전드 2세대의 부품을 그대로 수입해 한국에서 조립만 한 대형 세단이다. 부품 국산화는 양산 이후 몇 년이 지나서 이뤄졌고, 프린스 그리고 브로엄 거기에 아카디아로 이어지는 대우차 승용 라인업의 기함급 모델이었다.
전장 4,950mm, 전폭 1,810mm, 전고 1,405mm, 축거 2,910mm로 전반적으로 낮고 기다랗다. 그리고, 당시에 나왔던 그랜저보다 30mm가 짧았고, 나머지 수치는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었다. 3.2L 4밸브 SOHC V6 엔진을 탑재해 최대출력 220마력, 최대토크 29.2kg.m를 내었으며, 안전 최고 속도는 220km/h로, 그 당시 그랜저 3.0L V6보다 높은 스펙을 자랑해 국산차 중 가장 빠른 차였다. 겉모습은 후륜구동 승용차 같은 생김새를 취하고 있고, 변속기 내부에서 한 번 꺾여 등속 조인트에 출력을 전달하는 전륜 종치 방식이며, 국산차 중 최초로 순정 스트럿바를 장착해서 나온 차다.

4륜 더블위시본의 탁월한 운동성능과 승차감의 아카디아는 오너 드리븐 성격의 대형 세단이었고, 차체의 높은 비율이 적용된 아연 강판, 97년식 까지는 캐비티 왁스의 적용 범위가 하체는 물론이고, 선루프 배수로까지 발라주는 등 방청 성능 또한 뛰어났다. 차량의 원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좋다는 것은 다 넣고 좋은 것도 다 해줬다. 특히나 아카디아가 당시 동급 대형 세단 대비 운동성능이 좋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차들에 대비해 무게가 가벼웠다.
기아 포텐샤, 현대 그랜저가 1.8톤에 육박하는 무게에 허덕일 때, 아카디아는 한 급 아래의 중형차와 비교해도 될만한 1.5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혼다의 전설인 NSX와 같은 실린더 블록을 공유하는데, SOHC라는 메커니즘으로 보다 컴팩트한 엔진을 만들 수 있어 크기와 무게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추가로 엔진의 배치 또한 실내 안쪽으로 최대한 집어넣은 탓에 무게 배분 또한 전륜구동 치고 좋았다.

괜찮은 차를 단순히 소비자들이 몰라봐 판매가 안됐다는 일부 대우차 팬들이 한숨을 쉬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알아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다. 시대를 뛰어넘은 차는 확실히 맞지만, 가격마저 시대를 초월해버렸다. 1994년 출시 당시 출고가가 4,230만 원이었다.
중형차인 대우 프린스의 풀옵션 ACE 트림 모든 옵션을 다 때려 넣은 가격이 1,500만 원가량인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가격의 차이였다. 심지어 지금의 화폐가치를 생각하더라도 비싼 값이다. 기아 K8 시준 3.5 AWD가 최고 트림 가격이 4,526만 원인 걸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이다.


변호사 혹은 의사들이
선택하는 차
제5공화국 시절에 시행되었던 자동차 공업 합리화 조치가 1987년에 풀리게 되고, 승합 및 화물차의 생산을 맡았던 기아자동차에서 국내 승용차 시장에 복귀하여 부활을 알리는 오랜만에 출시하는 중형차다. 첫 출시는 1987년에 생산을 시작하였고, 마지막 단종인 1995년까지 생산을 하였다. 마쯔다의 카펠라 3세대를 기반으로 하여 약간의 변경을 통한 라이센스 생산을 한 모델이었다.
콩코드 특유의 스포티함과 첨단 이미지를 겸비해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 종사자 오너들의 중형차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며 단종 때까지 나름 선전했던 모델이었다. 마쯔다의 F 엔진을 사용하였고(1.8L~2.0L / SOHC, DOHC) 후에 잠시 동안 베스타 엔진을 활용한 2.0 RF 디젤이 추가가 되었다. 추후 영업용을 위한 LPG 엔진 또한 추가가 되었다.

첫 출시 이후 해가 갈수록 대우자동차 프린스보다 판매량에 있어 앞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1991년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를 걸쳤다. 특이점은 1992년 2.0 DOHC 엔진을 출시하게 되는데, 이 엔진은 마쯔다의 FE형 엔진이며, 특징이라면 유난히 정숙성이 좋았다. 그리곤, 추후 포텐샤에도 썼던 엔진이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군용 레토나에서도 이 엔진을 썼던 명기중에 명기였다. 이 2.0 DOHC 엔진을 장착함으로 최대 출력 139마력, 최대토크 18.5kg.m로 마쯔다의 엔진답게 고회전형 유닛이었다.
이 엔진을 달고 나온 콩코드는 한동안 고속도로의 제왕이라 불리우며 콩코드를 추월할만한 차가 별로 없었는데, 이유는 굉장히 가벼운 공차중량에서부터 비롯된다. 공차중량이 무려 1,170kg이며, 지금 나오는 중형차인 기아 K5의 공차중량이 1,450kg인 걸 생각해 보면 절로 수긍이 간다. 전장과 휠베이스 또한 짧았고, 당시의 기아차답게 서스펜션의 셋팅 또한 훌륭했던터라, 이후 후속작으로 나오는 크레도스도 동일한 엔진을 이어받았고, 선대의 중형차 콩코드의 뛰어난 동력성능을 이어나가며, 역사의 막을 내렸다.


누가 뭐라 해도
80년대의 최고급 세단
일명 각그랜저, 현대와 미쯔비시의 첫 합작품이다. 말이 합작이고 공동 개발이지, 파워 트레인을 비롯한 주요 부품들은 미쯔비시에서 다 설계하였고, 현대자동차는 외판 및 실내 디자인 설계에 일부 관여한 정도였다. 그런 미쯔비시가 굳이 현대차를 끌어들여 공동 개발이라 칭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
이유는 일본에서 대형차의 인기가 없기 때문인데, 판매량을 보장하기 힘든 일본시장의 현실이라 미쯔비시는, 잔머리를 굴려 현대와 함께 묻어가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거기에 미쯔비시는 그 당시의 규제 때문에 한국에 직접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시절이었기에,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상황이었고, 현대 또한 경제성장과 동반한 자가용 시장의 성장으로, 고급 세단이 필요했던 시기와 맞물려 서로가 서로의 요구 사항을 잘 들어주며 성공적으로 개발을 마쳤다.

조금 정리를 하자면, 현대가 개발비 상당 부분을 투자하는 대가로 관여한 게 바로 인테리어 디자인과 외판 디자인인 것이다. 그러고 난 뒤 1986년 7월, 등장하자마자 대우차 아니, 80년대 고급 세단의 철옹성 로얄 패밀리들을 (로얄 살롱, 슈퍼 살롱, 로얄 프린스) 무찌르고 단숨에 국내 대형차 시장 자리를 꽤 차 내었다. 초기에는 최대 출력 120마력의 시리우스 2.0L MPI 엔진을 시작으로 이후 배기량을 늘린 2.4L 시리우스 엔진 까지 내놨다. 동급 최대 출력 130마력을 자랑했다.
초창기에는 5단 수동변속기만 탑재하여 제공하였으나 얼마 뒤, 국내 최초 락업 클러치가 적용된 4단 전자제어식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그랜저를 선보여 고급 세단의 입지를 굳히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꾸준하게 판매를 이어오다 그랜저의 가장 절정기인 1989년 9월, 그랜저의 끝판왕 3.0L V6 엔진이 탑재되었다. 최대 출력 164마력으로, 당시 모든 세단들을 통틀어 당시의 대우차 임페리얼 다음으로 강력한 심장을 품었던 녀석이었다.
여기에 국산차 최초로 완전한 컴퓨터 제어 방식으로, 진일보된 MPI 엔진, ABS 장착, 거기에 차고 조절이 가능했던 국산차 최초의 에어 스프링 타입의 전자 제어 서스펜션까지 선보이고, 외판 컬러는 고급차의 상징인 투톤 컬러까지 겸해 한동안 고급차 시장은 그랜저 말곤 이야기가 안됐었다.


예나 지금이나
고속도로 후빨의 제왕
뉴 프린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린스를 말하는데, 사실 이전에 로얄 프린스라는 차를 잠깐 알아야 한다. 때는 1983년, 과거 GM과 연이 깊었던 대우차는, 중형차 라인업의 플랫폼을 오펠사의 레코드 E 바디를 가져와 판매를 하게 된다.
초창기 로얄 프린스는, 레코드 바디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조립한 수준으로 조립생산 및 판매를 하였다. 이러한 구식 독일차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여 만든 게 지금 소개할 프린스다. 맞다. 요즘에 사골 차라고 비판받는 차들의 원조격이라 생각하면 된다. 구식의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였지만, 외관의 디자인은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하였고, 외판 디자인은 대우자동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1991년 6월에 출시하게 된다.

유선형의 에어로 다이내믹 스타일로 디자인한 것이 큰 특징이며, 이는 외관만 좋게 만들려는 게 아닌 실제로 공기역학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이었는데, 당시의 국산차 공기저항 계수가 0.3 후반대의 수치를 보여준 반면 프린스는 0.31cd의 월등한 수치를 보여줘 당시에 매우 훌륭한 공력성능을 자랑했다. 게다가 구형 플랫폼을 사용한 만큼, 차폭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전폭의 수치가 동급 대비 가장 좁았지만, 좁은만큼 이점 또한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전면의 투영 면적의 유리함 이었다.
때문에 동급 차량들 대비 낮은 엔진 출력인 2.0L SOHC 엔진은, 최대 출력 115마력, 최대 토크 18kg.m의 다소 낮은 성능과 동력성능 효율에 불리한 후륜구동을 채택했음에도, 고속도로에서 그 성능의 빛을 발하여 동급 대비 뛰어난 안정성을 보여줬다.

이후, 페이스리프트를 통한 1996년 뉴 프린스가 출시하게 된다. 뉴 프린스가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출력의 문제로 인해, 원성이 자자했던 터라 2.0L DOHC 엔진을 도입하였고, 최대 출력 145마력, 최대 토크 20.1kg.m로 당시에 상당히 준수한 성능을 뽑아줬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전작에 비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었으나, 후면을 보면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센터패시아와 계기판 정도의 차이가 났고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똑같았다.
하지만 2.0 DOHC 엔진은 센서류가 잘나가는 고질병을 안고 있었다. 특히나 산소 센서가 잘나가 툭하면 경고등을 띄웠고, 프린스나 브로엄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2.0 DOHC 보다 SOHC 엔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정도였다. 후에 1997년 7월에 후속 차량인 레간자에게 바톤을 물려주며, 프린스의 역사 또한 완전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다만 택시 및 렌터카 사양은 대우 마크를 변경하고 일부 사양들을 변경하여 1999년 9월까지 병행 생산을 하였다.


당시 김우중 회장의
경영 마인드가 한몫했다
1997년 대우차는 레간자를 조금 급하게 출시를 하였다. 이유인즉, 당시의 정부가 독자 개발 승용차가 없으면 브랜드를 없애버리겠다는 엄포를 내려놓은 것인데, 현대, 기아, 쌍용은 어느 정도 국산화의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이라 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이 크게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대우는 이야기가 달랐다. 김우중 회장은 “기술은 사 오면 그만”이라는 경영방식은 그저 카피캣에 불과했다. 자동차의 노하우라곤 옛날 독일제 플랫폼을 조립생산 말곤 없던 터라, 당시에 레간자와 라노스의 개발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노르웨이에 대우차 QC 센터를 엄청난 금액을 들여 설립까지 하였고, 라노스와 누비라로 잠시 동안 좋은 세월을 보낸 대우자동차는 결국, IMF를 맞이해 버티지 못하고, 2000년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승용차 사업 부문을 GM이 완전히 인수하게 되었고, 나머지 상용차 부문은 타타자동차가 인수하여 공중분해가 되었다가 2005년 10월 완전한 GM 대우로 통합이 되어 지금의 쉐보레까지 오게 되었다. 오토포스트 이슈플러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