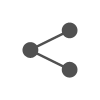난데없이 단종 설이 들려왔다. 출시 때만 해도 모든 이들의 관심이 쏠렸지, 출시된 이후의 행보는 조용하기 그지없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이 자동차의 행보를 비운의 현대차 ‘아슬란’에 비유하기도 한다. ‘기아 스팅어’ 이야기다.
워낙 이슈가 없어서 무난하게 잘 팔리고 있는 줄 알았으나, 최근 국내외 매체를 통해 단종 설이 나오기 시작했다. 오늘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는 최근 불거진 스팅어 단종 설과 함께 스팅어만큼은 단종을 막고 싶은 이유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
글 김승현 기자


단종하려는 기아차
막으려는 스팅어 담당자
국내 소비자들에게 워낙 신뢰 없기로 소문이 나있는 호주로부터 온 소식이라 그나마 안심이다. 그러나 방심하긴 이르다. 호주 ‘카 어드바이스(Car advice)’와 그레고리 기욤 독일 기아차 디자인 스튜디오 부사장이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스팅어가 단종될 위기에 놓인 가장 큰 이유는 판매 실적 부진이다.
전 세계적인 세단 판매 부진 여파가 스팅어를 강타했다. 유독 호평이 많았던 북미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한 이유다. 특히 호주 시장 판매량은 기아차가 전망하던 목표 판매량의 반 토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레고리 기욤은 이에 대해 “현재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기아차가 스팅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길 바란다. 인내해야 한다. 프리미엄 차량이든 이미지를 위한 차량이든 시간을 주어야 한다. 회사는 이 점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세단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팅어의 수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한다”… 그레고리 기욤이 한 말이다.
기욤의 발언을 보면 그는 스팅어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건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기아차 내에서 위치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나는 스팅어가 계속해서 살아남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판매 실적 부진으로 단종 시키려는 듯한 기아차, 그리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며 단종을 원치 않는 그레고리 기욤… 누구의 판단이 옳은 것일까?



과도기 겪고 있는 현대차
그래서 지적받는 정체성
현대기아 하면 떠오르는 것?
나는 그레고리 기욤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나는 기업가가 아닌 소비자이자, 기업 이윤보다는 시장 분석 시선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요즘 현대기아차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성장을 위해 디자인을 파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했고, 새로운 기술이라 불릴만한 사양들을 신차를 통해 선보이고 있다.
요즘 현대자동차그룹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이 과도기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삼각떼’라는 별명을 얻은 ‘아반떼’의 디자인 요소가 앞으로 출시될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내년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아반떼 풀체인지 모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네시스 신차들은 ‘G90’을 통해 보았던 패밀리룩을 거의 그대로 적용한다.


적어도 디자인만큼은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낫다”라는 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엠블럼만 빼면 완벽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디자인 정체성이 점차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스팅어’를 시작으로 ‘K3’, ‘K9’, 그리고 향후 출시될 신형 ‘K5’도 스팅어로부터 파생된 패밀리룩과 부품들이 상당수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팅어 단종 설이 유독 안타까운 이유다. 디자인은 자동차 제조사의 얼굴이자 브랜드의 기본적인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기아차는 패밀리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밑바탕이 완성되었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그다음 단계를 이끌어나갈 자동차가 ‘스팅어’인데, 출시 2년 만에 단종 설이 나오게 되었다.

말 많고 탈 많은 스팅어
역할만큼은 뚜렷했다
‘스팅어’가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뒷유리 품질과 관련하여 작년에 단독 보도를 내보내드린 바 있고, 엔진과 미션, 그리고 자잘한 품질 문제까지 직접 겪고 있다. 그러나 스팅어의 역할이 뚜렷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스팅어는 기아차에게 매우 중요한 자동차다.
기아차는 비교적 브랜드 정체성을 잘 만들어나가고 있다. ‘스팅어’, ‘프로씨드’ 등으로 실용적인 ‘펀 카(Fun Car)’를 갖춘 자동차 제조사, 스팅어가 떠오르는 패밀리룩을 갖춘 제조사로 점차 성장해나가고 있었다. 적어도 스팅어 단종 설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스팅어는 “기아차도 재미있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해외에 널리 퍼지도록 했다. 거침없는 혹평으로 유명한 영국 자동차 저널리스트 제임스 메이는 “기아 해치백(스팅어)은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았다”, “BMW M3처럼 엄청나게 맵지는 않지만 아우디 S4 정도로는 맵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제임스 메이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스팅어의 역할은 뚜렷하다. ‘쏘나타’나 ‘싼타페’처럼 판매량을 위한 자동차가 아닌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마니아들을 위한 자동차라는 것이다. 제조사 내에서 판매량 많은 자동차의 정체성을 잡기에는 부족하다면 재미와 마니아층을 위한 자동차가 브랜드의 정체성을 명확히 잡아줄 필요가 있다. 요즘은 둘 다 가진 자동차 제조사도 많다. ‘메르세데스 벤츠’ 하면 ‘S클래스’를 떠올리고, ‘포드’하면 ‘익스플로러’, ‘F-150’ 혹은 ‘머스탱’을 떠올리고, ‘쉐보레’하면 ‘실버라도’나 ‘카마로’를 떠올리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브랜드 정체성이 없지”
출시 2년 만에 단종 설
또다시 불거진 정체성 논란
이런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출시된 지 2년 만에 단종 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앞서 그레고리 기욤 인터뷰에서 살펴보았듯 가장 큰 이유는 판매량 부진이고, 일각에선 프리미엄 자동차로 나왔지만 상품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접한 국내 소비자들은 “잠깐 내놓고 안되면 바로 접고… 그러니 브랜드 정체성이 없는 것이다”, “스팅어 같은 차는 꾸준히 개발하고 마니아층을 위한 차로 남아주었으면 한다”, “스팅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평생 현대기아차에서 슈퍼카가 나올 확률은 제로다”라며 브랜드 정체성을 지적했다.


고성능 GT 세단에게 판매량?
판매량 vs 완성도
어느 것에 더 초점을 두었나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스팅어’로 높은 판매 실적을 원했다면 애초에 만들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기아차 스스로 스팅어를 개발할 때 판매량에 집중했는지, 고성능 차로서 가져야 할 완성도에 집중했는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아차는 스팅어 출시 전까지만 해도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테스트하는 모습, 비록 가상이지만 스포티한 엔진 사운드, 그리고 제로백 5.1초 등 성능 위주의 사양을 강조했다. 스포츠카에나 쓰이는 마케팅 요소들이다. 판매량을 위한 ‘쏘나타’나 ‘싼타페’에서 볼 수 있는 마케팅이 아닌 ‘911’이나 ‘머스탱’에게서나 볼 법한 마케팅이었다는 것이다.

스팅어는 현대기아차에게 없던
자동차 제조사에게 매우 중요한
모험이자 도전이었다
칼럼 여러 편을 통해 말씀드렸듯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모험과 도전을 계속한다. 페라리나 포르쉐를 논외로 하더라도 포드는 슈퍼카 ‘GT’와 스포츠카 ‘머스탱’을 만들고 ‘F-150 랩터’ 등 고성능 자동차도 만든다. 쉐보레는 미드십 슈퍼카 ‘콜벳’을 만들고 스포츠카 ‘카마로’를 만든다.
이 시국에 꺼내긴 그렇지만 일각에서 “그나마 따라잡기 쉬울 것 같다”라고 말하는 토요타렉서스는 V12 슈퍼카 ‘LFA’를 만들었고, 혼다는 하이브리드 슈퍼카 ‘NSX’를 만든다. 어떤 제조사는 이러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12년이라는 시간을 개발에 쏟아붓고,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개발 비용도 아낌없이 투자한다. 판매할 때마다 적자인 자동차임에도 말이다.

현대차와 기아차에게 모험과 도전이 얼마나 있었을까. 모험의 시작이 될뻔했던 ‘제네시스 쿠페’는 단종된 뒤 다시 부활한다는 소식이 뜸하고, 기아차가 내놓은 새로운 도전은 시작 2년 만에 단종 설에 휩싸였다. 어떤 모델을 단종할 때 어김없이 나오는 말은 “판매 부진”이다.
“돈을 버는 기업인데 안 팔리면 단종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에 일부 동의한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제1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동차 기업은 조금 다르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자동차 기업에게는 모험과 도전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이렇게 얻어낸 결과는 기술력 과시, 기술력 과시는 곧 제조사의 자존심이자 소비자의 자부심이 된다. 그리고 제조사의 정체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머스탱 1964년부터 55년간
카마로 1967년부터 52년간
정체성이 만들어진 시간
‘스팅어’를 두고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머스탱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스팅어만큼은 계속 만들어서 브랜드의 정체성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내 소비자들도 브랜드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판매량 때문에 섣불리 의미 있는 모델 하나를 단종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머스탱’이 아메리칸 머슬카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오랜 걸렸을까? ‘머스탱’은 1964년에 처음 출시되었고, 5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명을 이어가고 있다. ‘카마로’는 1967년부터 52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포드와 쉐보레의 베스트셀링 카라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포드와 쉐보레를 상징하는 모델로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50년 넘는 세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판매량을 위한 자동차
이미지를 위한 자동차
이제 명확해야 할 때
쌍용자동차에게 ‘지프 코란도’를 부활시키라고 선뜻 말하기가 어렵다. 정통 SUV가 쌍용차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도, 기업 사정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신차 개발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쌍용차에게 ‘모험’은 정체성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리스크다.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쌍용차 스스로도 충분히 정통 SUV 부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지프 코란도를 지금 부활시킬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다르다. ‘글로벌 기업’이라 불리는 쟁쟁한 경쟁사들과 함께 경쟁을 이어나가야 하고, 싸워야 할 무대도 한국뿐 아니라 북미, 호주, 캐나다, 인도 등 다양하다.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판매량을 위한 자동차’와 ‘이미지를 위한 자동차’가 명확하게 나뉘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포드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는 ‘GT’나 ‘머스탱’이 아닌 ‘F-150’이다. 쉐보레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는 ‘콜벳’이나 ‘카마로’가 아닌 ‘실버라도’다. 토요타렉서스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는 ‘LFA’나 ‘수프라’가 아니라 ‘캠리’, ‘RAV4, ‘ES’ 등이다. 혼다 역시 ‘NSX’가 아닌 ‘어코드’나 ‘CR-V’가 판매량을 견인한다.
‘스팅어’에게 ‘쏘나타’의 역할을 바랄 때가 아니라는 것이고, ‘제네시스 쿠페’에게 ‘싼타페’의 역할을 바랄 시기가 지났다는 것이다. 이제 기술력을 과시할 도전과 모험이 필요하다. 제네시스는 2도어 쿠페가 부활해야 할 것이고, 현대기아차는 고성능 라인업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팅어와 같은 이미지메이킹 모델들이 수명을 길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 기업’과 ‘상품을 만드는 기업’은 한 끗 차이다. 오토포스트 비하인드 뉴스였다.
autopostmedia@naver.com